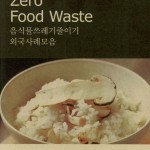우리동네 사람들 이야기 | 박재현
“저 나가서 살게요” 오랜만의 가족외식 시간에 폭탄 하나가 떨어졌다. 소고기를 굽던 엄마의 손이 허공에서 날 빤히 쳐다본다. 불쾌해지신 아빠의 얼굴은 불판 열기 때문인지 내 이야기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다는 말은 무색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큰아들의 ‘독립’이란 결혼으로 시작하며, 배우자와 단 둘이 거주하다 아이를 낳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등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인 것이다. 그런 부모님에게 남북회담을 꾸려가는 실무자의 심정으로 1~2주의 간격을 두고 세 차례의 대화를 나눴다. 핵심은, 나이 서른에 부모님 밑에서 지내는 게 면목이 없으며 내 손으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며 살고 싶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내 손으로 살아가기에 공동체는 최고의 대안이다, 공동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독립의 형태다 등이다. 담담히 말했고 날선 말은 모두 받았다. 세 번째 대화에서 부모님의 날은 무디어졌고 내 말은 단단해졌다. 그렇게 나는 ‘우동사’에서 살게 되었다.
대략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일상의 큰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그 사이의 여유시간을 채우는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아도 말끔히 정돈되어 옷장 속에 들어가 있던 세탁물을 챙겨야하고, 냉장고에는 언제나 꺼내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던 반찬통 대신 채소와 고기, 양념장 등 재료가 가득하다. 방 안 먼지와 머리카락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구멍난 양말을 꼬맬까 걸레로 쓸까 하는 고민은 이제 나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신상의 작은 변화를 넘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밥을 해주는 저이는 내 엄마가 아니고,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저이는 내 아빠가 아니다. 매주 생활에서 부딪히는 것이나 새롭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시금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이건 이런데 저것도 이렇다고?’ ‘그러면 다른 그건 왜 저렇게 하는데?’ 따위의 의문이 꼬리를 무는 일상이다. 불편하다. 자취하다 공동체 사는 친구들과 달리 부모님과 함께 살던 나는 생활비도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선택을 믿고 지지한다. 살아가며 겪는 불편은 부모님과 살며 일찌감치 체감했어야 할 일상의 진실이다. 집은 휴식의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활전선이다. 그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이 쏠쏠하다.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음식에 아직은 서먹하지만 그래도 숨 한 번 쉬고 침 한 번 삼키고 눈 한 번 감고 내어본 마음이 담겨있다. 식탁 위에서 터지는 웃음을 먹고 마시며 조금씩 친밀해지고 행복해진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나누는 밤엔, 별빛이 보이지 않아도 거실 한가득 반짝이는 눈빛에 환하기만 하다. 이렇게 나는 이제 막 함께 사는 길에 들어섰다. 정확히 말하자면, 따로 또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의 길 위에 첫 발을 내디뎠다. 남은 일은 잘 사는 것,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인 불편함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지혜를 배워나가는 것, 지혜를 얻어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이 말한 독립과 내가 말한 독립이 만나는 지점일 것이다. 그러니 내게 어색하고 어려운 걸음걸이일지라도 꾸준하게 조금씩 살아갈 일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과 함께.
# 에코붓다 소식지 2013년 3월~6월 호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