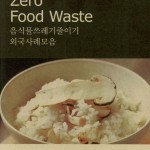생명을 품은 흙이 도시로 돌아온 날 | 최원형
최원형 | 생태 글을 쓰고 강의합니다.
저녁 먹을 시간 즈음 친구가 전화를 했다. 전화기 너머 친구는 대뜸, ‘홍대 앞에서 오늘 밤에 게릴라들이 나타난대, 구경 갈까?’ 도시농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홍대 앞에 모여 뭔가 재미난 이벤트를 벌인다고 알려줬다. 6,7년 만에 가본 홍대 앞은 사람 홍수였다. 복면을 한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모종을 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있는 공간 가운데는 여행용 가방이 덩그마니 있었고, 고장 난 전기밥솥이 보였다. 위가 뚫린 밀짚모자에도 여행 가방에도 흙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다. 젊은이들은 흙이 있는 곳이면 가방이든 밥솥이든 땅이든 모조리 채소와 꽃모종을 심고 있었다. 도시농업을 하는 이들이라고 친구가 귀띔해줬다. 포트에 담겨 군데군데 놓여있는 채소와 꽃들을 그 곳에 온 사람이면 누구나 흙에 옮겨 심을 수 있었다.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는 길 양옆으로 가게들이 죽 늘어서 있고 길 군데군데 화단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었다. 시멘트로 직사각형 혹은 타원 모양의 울타리를 친 화단은 흙만 담겨 있을 뿐, 방치되고 있어 온갖 쓰레기가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다. 쓰레기의 속성은 처음 누군가가 시작만 하면, 이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다. 첫 번째로 양심을 파는 일은 어렵지만 일단 내던진 누군가의 양심 위에 내 양심을 얹는 일은 생각보다 쉽다. 모든 핑계는 처음 시작한 이의 몫으로 남겨두면 되니까. 그렇게 외면해버린 공간을 도시농부들이 게릴라 작전을 펼쳐 생명이 자라는 땅으로 변신시키려는 게 이날 밤의 미션이었다.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홍대 앞 거리에서.

모자나 가방에도 채소가 심겨있는 모습
주말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 커플들이 신기해하며 다가왔다. 어떻게 심는지 아세요? 젊은 도시 농부가 물었고, 잘 모른다는 그들에게 곧장 모종을 심는 요령을 가르쳐줬다. 마지막에 흙을 꾹꾹 눌러줘야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농부라고 하면 시골에 나이 지긋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내게 스물 몇 살 쯤으로 보이는 젊은이의 자연스런 손놀림은 참 신선했다. 중년 부부가 지나가다 말고, ‘저거 치커리잖아’ 이러며 다가와서는 후딱 한 포기 심었다. 모종을 심고 물을 주느라 흙은 질척거렸다. 한번 만지면 금세 흙손이 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종을 심느라 쪼그리고 앉아 웅성거렸다. 사람들의 얼굴이 꽃처럼 피어나는 걸 나는 그 순간 발견했다. 흙을 만지는 사람들 얼굴은 하나같이 밝았다. 오랜 세월 우리들 유전자에 내재되 있던 고향의 감촉이란 걸 그들은 기억했을까.
쓰레기 더미였던 곳이 화사하게 생명을 맞이하며 명랑한 의식이 거의 마무리되어갈 즈음, 반도네온과 타악기 등이 어우러진 음악이 들려왔다. 고작 삼사십 분이 전부였을 거다. 풍물패들의 짤막한 공연부터 모종을 심고 음악 연주에 귀 기울이며 그곳에 함께 했던 시간이. 그 짧았던 시간이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게 점점 생명을 달고 살아나는 거다. 오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느닷없이 그곳에 갔던 나도 엉뚱했지만, 도시 한 복판에 느닷없이 모종을 심고 음악연주까지 하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린 이 게릴라들도 참 재미나게 엉뚱했다. 이런 엉뚱한 퍼포먼스가 왜 내게 잊혀지기는 커녕 더욱 또렷하게 되살아나는 걸까. 어쩌면, 외면하고 버려진 한 뼘 땅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이들의 의도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처절한 절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정신이 번쩍 났다.

쓰레기더미였던 곳이 생명이 자라는 텃밭으로 변했다
“농사”, “농업”, 저기 저 구석에 처박힌 채 먼지 뒤집어쓰고 있던 낱말이었다. 산업화의 뒤안길에서 홀대 받으며 설움 삭히던 그 농사가 실은 우리들의 생명을 이어줬다는 걸 이제 도시사람들도 자각하는 듯하다. 도시텃밭이라는 말은 이미 낯설지 않은 고유명사다. 내 주변에서도 식구들 먹을 채소는 스스로 지어 먹는 이웃들을 보게 된다. 봄이 오면 텃밭을 분양받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주말이면 그리로 모인다. 그곳, 텃밭에는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모인다. 이웃을 만나기 쉽지 않았던 아파트 문을 열고나서니 텃밭이 있었다. 텃밭에서 곁에 살던 이웃을 만난다. 어쩌면 ‘나만 잘 살아보세’하고 달려온 세월의 끝은 참 외로웠던 것 같다. 도시인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외로움, 사람은 넘쳐나는데 늘 혈혈무의했던 그 긴 터널의 끝에서 텃밭을 발견한 거다. 끊어진 대화는 텃밭을 일구며 이어지고, 닫혔던 이웃 간의 말문이 텃밭 고랑에서 열리는 걸 이제 도시인들은 조금씩 맛보고 있는 중이다.
홍대 앞 게릴라들의 퍼포먼스는 2004년 리처드 레이놀즈라는 영국 청년이 시작했던 일이라고 한다. 쓰레기가 쌓여가던 곳을 사람들은 그저 수수방관하며 구청에서 치워주기만을 기다렸는데, 리처드는 그곳에 꽃을 심었다 한다. 그리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한다. 어쩌면 그 이전, 잊혀져간 어떤 이들이 도시로 흙을, 생명을 가져오려던 지난한 노력들 가운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일명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말로 들불처럼 전 세계로 번져가는 ‘바람들’ 가운데 하나를 나는 홍대 앞에서 만났다. 버려진 도시의 공공지에 밤새 몰래 생명을 심어 놓고 유유히 사라져 버리는 게릴라 가드닝. 손이 닿지 않는 공간에는 씨앗과 흙을 버무려 만든 씨앗폭탄을 던져 어떻게든 흙에 생명이 자라길 바라는 원을 세우는 게릴라 가드닝.
홍대 앞, 그 게릴라들의 전언은 이랬다.
“도시가 이래도 되나 문제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이 걸어 나와 현현한 것이 곧 세상이니까. ‘나만 잘 살아보세’가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었던 건, 세상 모두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진리를 거리에서 만나고 나는 참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생명을 품은 흙이 도시로 돌아오다니.
글쓴이 최원형 : EBS와 KBS에서 방송작가로 일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 책을 눈여겨 읽기 시작했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환경ㆍ생태 책을 읽고 고르는 활동을 했으며 노거수 살리는 일에도 참여했다. 자기 방에 유령거미가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딸과 아파트 베란다에서 2년째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아들과 함께 도시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고 있다.
# 에코붓다 소식지 2013년 3월~6월 호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