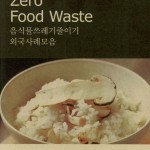텃밭과 경작금지 | 백승권
도시텃밭 이야기
어머니의 텃밭과 경작금지
백승권 | 작가, 글쓰기 교수
경의선 전철 공사가 끝난 뒤 철도 유휴 부지가 그냥 공터로 방치됐다. 원래는 시에서 그곳에 가로공원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잡초만 무성한 공터로 남게 됐다.
이 우연찮은 일이 그 주변에 살던 일산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방치된 공터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꼭 슬럼가를 지날 때 짓는 표정이었다. 나이가 마흔 줄을 넘긴 사람들은 그 공터 옆을 지날 때마다 어떤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 길을 가다 돈을 주운 사람 같은 얼굴이었다.
한동안 잡초는 안심하고 자랄 수 있었다. 봄과 여름을 지나며 강아지풀, 바랭이, 쇠비름, 질경이들이 무럭무럭 자랐다. 바람결 외에 누구도 이들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터 주변엔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100미터 달리기 출발선에서 출발신호를 기다릴 때처럼.
어느 날 공터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공터 한 쪽의 풀들이 사라진 것이다. 누가 억센 풀을 모두 뽑아내고 검붉은 땅의 맨살을 드러냈다. 그 다음 날 그 땅엔 높고 낮은 고랑과 이랑이 몇 줄 생겼다. 공터에 텃밭이 탄생했다.
드디어 신호총이 울린 것이다. 출발신호만 기다리던 주민들은 일제히 공터에 몰려들었다. 제각각 자기 힘닿는 데까지 풀을 뽑아내고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풀밭은 순식간에 아파트 주민들의 문전옥답으로 바뀌었다.
어느 휴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는데, 팔순이 가까운 나의 노모가 득의만만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지하도 출입구 근처에 열 평 남짓의 텃밭을 일구었다는 말씀이었다. 나와 아내는 몸도 성치 않으신데 한 여름 땡볕에서 그 힘든 일을 왜 하셨냐고 지청구를 보냈지만, 은근히 텃밭이 궁금해졌다.
큰길가 쪽으로 붉은 흙살이 좋아 보이는 곳에 어머니가 일군 텃밭이 보였다. 나와 아내는 텃밭을 한참 바라보고 손으로 흙을 만지며 만면의 웃음을 지었다. 우리 집 소유라도 된 것 처럼 텃밭을 눈과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자니, 어머니가 한 말씀하셨다. “무얼 심을까?”
늦여름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은 많지 않았다. 무와 열무는 씨로 심고, 쪽파는 구근으로 심었다. 땅이 원래 습한 데다 비까지 적당히 내려 두 주 일만에 어린 싹을 볼 수 있었다. 무와 열무의 새싹은 하트 모양이었고 쪽파에선 성게처럼 가느다란 연둣빛 침이 돋았다. 상추는 모종으로 한 판을 심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유모차에 물통과 연장을 싣고 텃밭 나들이를 하셨다. 나는 별로 할 일은 없었지만 주말마다 텃밭에 나갔다. 텃밭 가에 서서 무와 열무와 쪽파가 지난주보다 얼마나 자랐는가를 보는 게 전부였지만, 그 순간이 더 없이 평안하고 행복했다.
더위가 가시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절기는 한로를 지나 상강을 앞두고 있었다. 무는 너풀너풀 잎이 두 뼘이나 자랐고 땅 속 뿌리가 팔뚝 두 배만큼 굵었다. 열무는 바로 뽑아서 김치를 담그기 딱 좋을 만큼 자랐다. 쪽파 잎은 막내 딸 새끼손가락 굵기만큼 굵어졌다. 이번 주말 서리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겠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주말 아침 온 식구가 부푼 기대를 안고 텃밭으로 나섰다. 아뿔싸. 텃밭 위의 푸른 기운은 싹 사라지고 붉은 맨 흙살만 드러나 있었다. 흙살 사이에 무와 열무, 쪽파가 파묻힌 흔적이 드문드문 보였다. 포크레인으로 텃밭을 긁었는지 포크레인 삽날의 굵은 흔적이 선명했다.
며칠 뒤 텃밭 가엔 ‘경작금지’라고 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현수막 옆엔 ‘앞으로 농사를 짓지 마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구, 아까워서 어쩌나.” 하면서 흙에 파묻힌 채소들을 어루만졌다. 나와 아내는 그 살풍경을 그냥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름내 어머니의 수고로 만들어진 텃밭은 다시 공터로 돌아갔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공터엔 ‘경작금지’ 빨간 글씨가 선명한 현수막이 낡은 채로 붙어 있고 잡초가 뽑다만 닭털처럼 을씨년스럽게 널려 있었다.
꽃샘추위가 지나고 봄볕이 따스운 어느 날이었다. 봄 햇살을 등에 받으며 사람들이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띠었다. 그러더니 잡초가 서서히 사라지고 검붉은 흙의 맨살이 다시 드러났다. 곧이어 푸릇푸릇한 무엇이 다시 하나 둘 심겨졌다.
겨울처럼 우울했던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어머니의 하루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 에코붓다 소식지 2013년 11-12월 호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