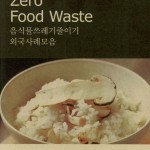[중앙일보] 냉장고가 너무크다
방송날짜: 2004.11.04 22:39:09

[삶과 문화] 냉장고가 너무 크다
농촌에서 자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못 버린다. 먹다 남은 파 대궁이나 무 조각을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에 넣는 친구의 방식이 부럽긴 해도 그걸 감히 따라하지는 못했다.’먹을 걸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는 이데올로기가 아주 어려서부터 주입된 까닭이다. 키우던 소가 눈물을 뚝뚝 흘려 사연을 들어보니 전생에 쌀의 뉘를 안 먹고 버린 죄로 소가 됐다는 둥, 무실댁 며느리가 설거지하다 버린 밥풀을 사랑어른이 찬물로 헹궈 드셨다는 둥, 혀를 차면서 할머니가 들려준 무서운(!) 이야기가 한 둘이 아니었다. 밥 먹다 뉘가 나오면 손으로 껍질을 벗겨 입 안에 넣고나서 할머니께 검증을 받았다. “나 소 안 되는 거 맞지?”
그랬던 나도 어느새 슬슬 음식을 버리기 시작했다.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가 됐으니 버리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예전에는 남은 음식을 깨끗이 버리는 게 도회적 세련으로 보이더니 막상 내가 해보니 아니었다. 기분이 개운찮은 건 그만두고라고 반은 먹고 반은 버린다면, 이미 내 뱃속에 들어간 음식도 천덕스럽게 격하된다는 걸 알았다. 뭐든 귀해야 정성이 담기고 정성이 담겨야 가치가 생긴다는 건 시대를 통틀은 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5조원이라 한다. 억이 아니라 조라고? 전화해서 일부러 확인을 했다. 버려지는 양에 일정한 액수를 곱해 나온 금액이라 한다. 서울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만도 하루 2600t이란다. 무섭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잘사는 나라에 살게 돼 버렸나.
건축가 승효상은 십여년 전에 ‘빈자의 미학’을 선언했다. 그의 작업실 이로재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길고 가팔랐다. 불편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급경사를 통과하고 들어선 넓은 방이 다른 세계의 열림같이 더 새롭고 유쾌해지는 경험을 줬다. 집을 지을 때 기능과 편리만을 따질 게 아니라 쓸모없이 텅 비워두는 무위의 공간을 많이 두며, 적당히 불편해야 건강한 집이라는 그의 주장에 나는 열렬하게 동감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편리함만을 좇아온 우리 삶이 과연 실질적으로 편안해졌어요? 물질이 흔한 대신 정신이 왜소하고 자폐적이 되어간다면 그게 진정 잘사는 겁니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른자루 넘는 몽당연필은 아름다웠다. 빈(貧)을 미(美)와 연결시킬 때 예상찮은 향기가 풍긴다는 걸 나는 장식 없는 그 방에서 발견했다.
한때는 말린 감껍질이 내게 제일 맛있는 간식이었다. 늙은 호박을 삶아 볶은 콩가루를 묻혀 떡인 듯 먹었다. 부족했나? 아니다. 행복했다. 미각과 후각이 놀랄만치 발달한 나다. 풍덩풍덩 버리면서 먹었다면 어쩌다 과육이 두껍게 남아있는 감껍질의 황홀한 단맛을 몰랐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음식을 마구 버리게 된 건 배고픈 시절의 복수일 수도 있다. 좁고 불편한 집에 한이 맺혀 그동안 무조건 넓고 편리한 집만 찾아다녔을 게다. 이제 실컷 해봤다. 한해 15조원이나 갖다버렸다지 않는가. 이만하면 콤플렉스는 충분히 풀었다. 북한산 아래 예쁜 비닐 하우스를 치고 사는 데니와 젬마 부부, 그들의 냉장고는 손바닥만하다. 김치 외의 식품은 저장하지 않는다. 따뜻한 차에 고구마 두어개면 한끼가 족한데 음식을 꾸역꾸역 쌓아둘 필요가 있나? 데니가 맑은 눈으로 나를 본다. “청빈해야 내면이 강해져서 행복해져요. 청빈은 가난과 정직이죠.” 우리집 장롱만한 냉장고가 부끄럽다. 그 안에 든 음식을 나는 아마 괴로워하면서 버릴 것이다. 마침 불교정토회 스님들이 ‘빈그릇운동 – 음식 남기지 않기 10만 서약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안이 벙벙하셨을 것이다. 당연한 일에 무슨 캠페인을 다?
김서령 생활칼럼니스트
2004.11.02